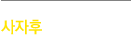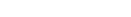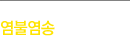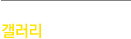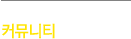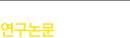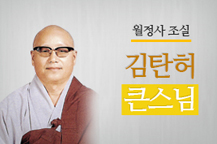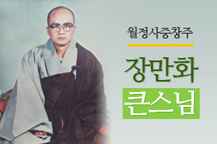한암스님 원고 44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행 스님 작성일20-01-29 16:30 조회3,931회 댓글0건본문
병약하고 당돌했던 열네 살 어린 소녀가 절 밥을 세 번만 얻어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속가의 이모인 본공(本空, 1907~1965) 스님을 따라 월정사 지장암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자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던 소녀는 “네 눈빛을 보니 너는 가지 말고 여기 살아야겠다.”라고 하신 한암(漢岩) 스님의 말씀대로 평생 절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절이 그리워진 소녀는 부모님의 반대를 뒤로 한 채, 금강산의 삼일포에서 더 들어간 고성에서 오대산 상원사 지장암(地藏庵)에 이르는 멀고 험한 길을 되짚어 왔습니다. 38선이 막히는 바람에 두 번 다시 부모님을 뵐 수 없었던 경희(慶熙, 1931~ /대구 서봉사 회주) 스님의 동진 출가(童眞出家 :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일)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경희 스님은 한암(漢岩) 스님을 어려운 큰스님이 아니라 자상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1946년 1월 한암(漢岩) 스님에게 사미니계를 받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저의 스님이 저를 상원사로 데리고 가서 법당에 꿇어앉아 계를 받는데, 다리가 저려서 계의 내용이 후반에 가니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와요. (중략) 그날 점심밥을 먹고 나서 방으로 또 들어오라고 해서는 5계, 10계, 식차마나니계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는 한암(漢岩) 스님에게 “큰스님! 그만 꿇어앉으라고 하세요. 다리가 저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만 잘 알아듣잖아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탄허 스님이 “하여튼 얘는 양반 뼈를 삶아먹고 온 애”라고 한 마디 하셨지요.
한암(漢岩) 스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꿇어앉으면 얼마나 발이 저리고 아프겠냐?”라고 하시면서 편히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 제가 식차마나니계를 받을 때는 편히 받았어요. 탄허 스님이 그 후에도 저만 보시면 “또 편히 앉아 계 받으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놀렸지요. (중략)
경희 스님은 한암(漢岩) 스님에게 사미니계를 받고 4년 동안 오대산 월정사 지장암ㆍ내원사ㆍ부도암 등에서 8안거를 성만한 뒤 1956년 경남 해인사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1966년 경남 해인사 자운 화상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습니다. 이듬해 경남대학교 문학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대구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서봉사 주지로 취임합니다. 경희 스님의 남다른 학구열에는 한암(漢岩) 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옛날 스님네는 자신을 칭할 때 ‘스님’ 소리를 안 하고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 저는 한암(漢岩) 스님에게 “스님, 자꾸 중, 중 하십니까? 저는 듣기 싫어요.”라고 반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암(漢岩) 스님께서는 “그래. 아한테도 배워야겠구나.” 하시면서도 항상 “우리 ‘중’은 겸손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정진하는 도중에도 우리 ‘중’은 무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서봉사 회주로 계신 경희 스님은 뇌묵(雷默, 1925~/월정사 육수암) 스님과 더불어 한암(漢岩) 스님에게 사미니계를 받고 생존해 계신 비구니 중 한 분입니다.
서봉사는 1920년경 한 신녀가 창건하고, 탄응·동운·전강·학봉 스님 등 여러 대덕들이 주석했던 곳으로, 1952년 경희 스님의 은사인 본공 스님이 결제 후 해제 때면 보림 하면서 사원을 수호하고 불법을 선도했던 사찰입니다. 1970년 주지로 취임한 경희 스님은 본래의 목재 요사를 헐고 대웅보전과 명부전, 삼성각 등 현재 위용의 기초를 이루는 본격적인 중창 불사를 시작해 점차 그 규모를 보완하고 늘려가며 가람의 위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통도사 적멸보궁의 대웅전을 축소하여 지은 대웅보전은 7년이라는 긴 공사기간이 말해주듯 지붕이며 내ㆍ외관 모두 독특한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당을 지을 당시 자운 스님과 초우 스님의 자문과 감독을 청할 정도로 기단석에서부터 지붕의 기와에 이르기까지 전각 한 동 한 동마다 온 정성을 쏟았던 대중 스님들은 어느 정도 사격이 갖추어지자 그 정성을 수행과 포교로 돌렸습니다.
서봉사를 여러 대중 스님들이 함께 정진하고 포교하는 공간, 자신과 이웃을 정화하며 부처님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한국불교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경희 스님의 서원과 대중 스님들의 노력 속에 서봉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불자와 일반 시민이 공유하는 수행과 힐링의 도심 포교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948년 뇌묵(雷默)이라고도 불리는 비구니 희원(喜元) 스님에게 진주(眞住)라는 법호와 함께 『신심명(信心銘)』에 있는 게송을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이것이 한암(漢岩)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이름과 법호, 게송입니다.
<비구니 희원에게 주다-증 비구니 희원(贈 比丘尼喜元)>
인연을 쫓아가지도 말고,
공무(空無)에도 빠지지 말라.
한결같이 마음이 평온해지면
모든 번뇌는 저절로 녹아 없어지리라.
-불기 2975년(1948년) 무자 6월 17일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漢岩) 쓰다
한암(漢岩) 스님께 계를 받고, 스님께서 직접 써 주신 이름과 호, 화두가 담긴 친필 문서를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한 채 “적게 먹고, 강력하게 정진해야 한다.”라는 한암(漢岩) 스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한암(漢岩) 스님을 세세생생 존경해야 하는 스승으로 생각하신다는 뇌묵 스님의 회고담을 통해 한암(漢岩)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난하여 세속에서도 살기가 너무 어렵지만, 절에 들어와 중노릇 하기도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셨어. 먹고 죽지만 않으면 모든 것을 먹고서라도 정진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하셨지. 예전의 선지식들도 칡뿌리 캐먹고, 바위에 흐르는 물도 먹고 정진을 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진 수도를 제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중략)
입산 후 첫걸음에 만난 큰스님이지만, 이분같이 살아온 스님이 없어요. 한암(漢岩) 스님같이 자비하고 원만한 도인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 스님은 불가와 세속에서도 전혀 걸림이 없는, 통달한 인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암(漢岩) 스님께 배울 점은 근검절약입니다. 아끼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으로는 정진에 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암(漢岩) 스님은 정진이 아니면 중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뇌묵 스님은 현재 월정사와 100m 정도 떨어진 골짜기 언덕에 자리 잡은 비구니의 참선 도량 육수암에서 정진하고 계십니다. 육수암은 월정사 산내 암자로 여섯 손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신 육수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는 곳으로, 결제 기간에는 30여 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 정진을 하십니다. 백수(白壽)를 바라보는 연세에도 밝고 맑은 성품을 지니고 계신 뇌묵 스님은 불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바탕 꿈꾸다 가는 세상, 아옹다옹 불평불만 늘어놓고 살 것 있는가.
내게 허물이 없으면 남의 허물도 보이지 않는 법,
항상 부드럽고 선하고 어질게 살면 된다.
인과를 믿으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고 모두가 편안하다.
그것이 또한 불법이다."
지장암에서 출가하여 한암(漢岩) 스님의 수행 가풍을 배우고 그것을 평생 동안 실천하신 비구니 진관(眞觀, 1928~2017) 스님은 한암(漢岩) 스님을 일러 대중 화합을 으뜸으로 삼으신 스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암(漢岩) 스님의 말씀은 “공부를 하는 데는 화롯불의 재를 들쑤셔 봐서 불씨가 하나도 없이 다 꺼진 재라야 된다.”라는 것이었어. 중노릇을 하는 데는, 화로 재에 그런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다 식은 재라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불씨가 있으면 다시 불이 살아나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중노릇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하심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 (중략)
한암(漢岩) 스님은 대중의 뜻을 귀하게 여기셨어. 당신의 뜻도 중요하지만 늘 대중 화합이 제일이라고. 당신 뜻이 아무리 옳아도 여기에 앉아있는 대중이 “스님, 그건 안 맞습니다.”라고 하면 대중의 뜻을 따르셨지. 당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으셨어. 한암(漢岩) 스님은 대중 위주로 사신 분이야.
열네 살이 되던 1944년 강릉 보현사에 입산하여 1945년부터 4년간 월정사 강원에서 수학한 후 강릉사범학교를 다니셨던 덕수(德修, 1931~?) 스님은 시봉하는 사람조차도 비구니나 여자 신도를 두지 않으셨던 한암(漢岩) 스님의 행을 청정 계율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의식에도 능통하셨다는 회고담입니다.
스님은 어산과 의례를 잘하셨지요. 손수 만든 예참(禮懺 : 부처나 보살 앞에 예배하고 죄과를 참회함)도 있어요. 제가 스님이 짓고 제작한 예참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스님이 옛날에 지으신 것인데, 예전에는 다 외웠지만. 당시 전국에서 재나 의식을 한다든가 다비를 할 때에는 스님이 만든 대 예참(大禮懺 : 부처나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절을 많이 하는 예법)을 갖고 하였어요. 지금도 서울의 비구니 절인 탑골 승방의 비구니 스님네들은 아마 스님의 예참을 다 외울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