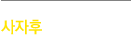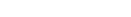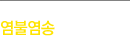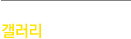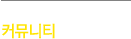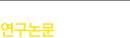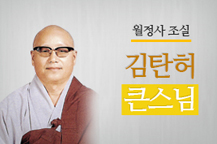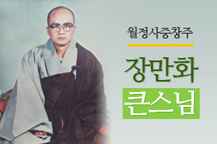[월정사 역사와문화] - 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2-05 13:00 조회5,157회 댓글0건본문
Ⅱ. 고려시대; 화엄성지의
중건과 역사의 재인식
3. 오대산 불교와 나옹혜근
이후 1377년(충렬왕 33)에 가람은 화재로 전소되었고, 다시 이일(而一)스님이 중창하여 조선시대까지 법등을 이어 나갔다. 고려 후기 월정사의 자취는 문신이었던 정추(鄭樞, 1333∼1382)가 지은 2편의 시에만 남아 전한다.
자장이 지은 옛 절에 문수보살이 있으니,
탑 위에 천년 동안 새가 날지 못한다.
금전은 문 닫았고 향(香) 연기 싸늘한데,
늙은 스님은 어디로 시주를 가셨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불우(佛宇).
금강연 물이 푸르게 일렁거려, 갓 위에 묵은 먼지를 씻어낸다.
월정사에 가 옛 탑을 보려 하는데,
석양에 꽃과 대[竹]가 사람을 매우
근심스럽게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산천.
고려 후기 소실되고 난 직후의 월정사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일 스님에 의해 중창되기까지의 상황이다. 하지만 대산의 당우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월정사만의 상황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
소개하겠지만 「오대상원사승당기」에 의하면, 터만 남아있던 상원사의 승당불사를 1376년부터 77년 사이에 걸쳐서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고려 후기의 인물 중에서 오대산 및 월정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옹 혜근이다.
내가 삼가 살펴보건대, 스님의 휘(諱)는 혜근(惠勤)이요,
호는 나옹(懶翁)이며,
초명(初名)은 원혜(元惠)이다. 향년은 57세이고 법랍(法臘)은 38세이며,영해부(寧海府) 출신으로서 속성(俗姓)은 아씨(牙氏)이다. 부친 휘 서구(瑞具)는 선관서(膳官署) 령(令)이요, 모친
정씨(鄭氏)는 영산군(靈山郡) 사람이다. 정씨의 꿈속에 황금색 송골매가 날아와서 머리를 부리로
찍더니 홀연히 알을 떨어뜨렸는데, 오색찬란한 그 알이 자신의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임신하여 연우(延祐) 경신년(1320, 충숙왕7) 정월 15일에 스님을 낳았다.
나옹 스님의 휘(諱)는 혜근(惠勤)이요, 호는 나옹(懶翁)이며, 속며은 원혜(元惠)이다. 왕사로서 보제존자(普濟尊者)라는 존칭을 사용하였다. 공덕산묘적암의
요연(了然) 선사에게 출가하여 4년간 머물렀으며, 다시 회암사에서 4년 간 정진한 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원나라에 들어가 많은 지공 등의 선사들로부터 깨달음의 인가를 받았다.
행장에는 원나라에서의 적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 신묘년(1351, 충정왕3) 봄에
보타락가산(寶陀洛迦山)에 가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예배하였다. 임진년에 복룡산(伏龍山)에 가서 천암(千巖)을 친견하니, 천암이 마침 강호(江湖)에서 모여든 천여
명의 납자(衲子)를 대상으로 입실(入室)할 자격이 있는 자들을 뽑고 있었다. 천암이 스님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자 스님이 대답을 하니, 천암이 “부모님이 낳아 주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다가 왔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스님이 “오늘이 바로 4월 초 이틀입니다.”
하니, 천암이 인가를 하였다. 이해에 북쪽으로
돌아가서 지공(指空)을 재차 친견하니, 지공이 법의와 불자와 범서(梵書)를 전해 주었다. 이에 연대(燕代)의 산천을 두루 유력(遊歷)하였는데, 유유자적하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하나의 한도인(閑道人)으로서, 명성이 자자하게 퍼져 마침내는 궁중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을미년(1355, 공민왕4) 가을에
성지(聖}旨)를 받들고 대도(大都) 연경(燕京)의 광제사(廣濟寺)에 머물렀다. 병신년 10월 보름날에 개당 법회(開堂法會)를 열자, 황제(皇帝)가 원사(院使) 야선첩목아(也先帖木兒)를 보내 금란 가사(金襴 袈裟)와 폐백(幣帛)을 하사하였고, 황태자(皇太子)도 금란 가사와 상아 불자(象牙拂子)를 선물하였다. 스님이 가사(袈裟)를 받고는 대중에게 묻기를 “담연(湛然)히 텅 비고 고요해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인데, 이 찬란한 가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였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자 스님이 천천히 말하기를 “구중궁궐 안의
부처님 입에서 나왔느니라.”하였다. 그러고는 분향(焚香)하고 황제의 복을 축원한 다음에 법좌(法座)에 올라 주장자(柱杖子)를 가로잡고서
몇 마디 말을 하고는 바로 내려왔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보우와 마찬가지로 나옹 역시 지공선사나 평산처림선사 등의 인가를 받고 있다. 나옹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단박에’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대혜의 간화선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또한 ‘무자(無字)’ 화두를 중시하는 경향이나, 몽산덕이(夢山德異) 화상의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을 중시하는 것이나, 1350년에는 휴휴암에서 안거를 지내는 등의
행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은 나옹 역시 고려 후기의 간화선사들처럼 몽산의 사상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나옹이 지공선사와 평산처림선사에게서 법맥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이후 한국 간화선의 큰 맥락 중의 하나를 형성하게 되는 점이다. 원나라에서 유력한 내용을 전하는 위 인용문은 그러한 인가의 전후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술년(1358, 공민왕7) 봄에
지공과 작별하면서 수기(授記)를 받고 동방으로돌아올 적에, 가다 쉬다 하면서 중생의 근기(根機)에 따라 설법을 해 주었다. 경자년에 오대산(五臺山)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신축년
겨울에 상이 내첨사(內詹事) 방절(方節)을 보내 스님을 서울로 맞아들인 뒤에, 심요(心要)에 대한 설법을 청하였다. 상은
스님에게 만수가사(滿繡袈裟)와 수정불자(水精拂子)를 하사하였고, 공민왕의 비(妃)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는 마노불자(瑪瑙拂子)를 바쳤으며, 태후(太后)는 직접 보시(布施)를 베풀었다. 상이스님에게 신광사(神光寺)에 있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스님이 사양하였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나도 불법(佛法)에서 뒤로 물러나 있겠소.”하였으므로, 스님이 어쩔 수 없이 곧장 신광사로 떠났다.
11월에 홍건적(紅巾賊\)이 경기(京畿) 지방을 유린하자, 온 나라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하였다. 이에 승려들도 겁에 질린
나머지 피신할 것을 청하였으나, 스님은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지키고 있는데, 적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태연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승려들이 더욱
급하게 피신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날 밤 스님이 꿈을 꾸니 얼굴에 검은 사마귀가 있는 신인(神人)이 의관을 갖추고 절을 하면서 고하기를 “대중이
흩어지면 도적들이 반드시 이 사찰을 없애 버릴 것이니, 스님은 뜻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토지신(土地神)을 안치한 자리에 가서 그 초상화를 보니 꿈속에 본 바로 그 얼굴이었는데, 과연
도적이 그 사찰에는 이르지 않았다.
계묘년(1363, 공민왕12)에
스님이 구월산(九月山)으로 들어가니, 상이 내시(內侍) 김중손(金仲孫)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청하였다. 을사년 3월에 대궐에 나아가서 물러가게 해 줄 것을 청한 결과, 비로소 허락을
받고 숙원(宿願)을 이루어 용문(龍門)과 원적(元寂) 등 여러 산사(山寺)에 노닐었다. 병오년에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갔다. 정미년 가을에는
청평사(淸平寺)에 머물렀다. 그해 겨울에 예보암(猊寶巖)이 지공(指空)의 가사(袈裟)와 손수 쓴 편지를 스님에게 전해 주면서
지공의 유언(遺言)이라고 하였다.
기유년(1369, 공민왕18)에
다시 오대산(五臺山)으로 들어갔다. 경술년 봄에 사도(司徒) 달예(達叡)가 지공의 영골(靈骨)을 받들고 와서 회암사(檜巖寺)에 안치하였으므로, 스님이 스승의 유골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고는 상의 부름에 응하여
광명사(廣明寺)에서 하안거(夏安居)를 마쳤으며, 가을 초에 회암사로 돌아왔다가 9월에 위에서 언급한 공부선(功夫選)을 거행하였다.
<『목은문고』14, 「보제존자시선각의
탑명병서(普濟尊者諡禪覺塔銘)」>
나옹은 몇 차례인가를 오대산에 들어와서 주석하고 있다. 나옹은 공민
왕 시기에 고려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애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사실
그의 오대산 행은 그러한 개혁 시도가 무산되면서, 새로운 행보를 모색하던 시기에 이루어지던 것이다. 나옹이 오대산에 머물 때 환암혼수(幻庵混修,1320∼1392) 역시 오대산 신성암에 머물고 있었다. 충주 청룡사에
있는 「보각국사정혜원융탑비(忠州靑龍寺普覺國師幻庵定慧圓融塔碑)」에 오대산에
머물때의 나옹과 환암혼수의 교유에 대한 기록이 있다.
현릉(玄陵, 공민왕)이 선사의 행적이 바른 것을 높이 여겨 회암사(檜巖寺)에 머물기를 청하였으나 가지 않고, 곧 금오산(金鰲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오대산(五臺山)에 들어가 신성암(神聖}菴)에 거처하였다. 이때 나옹혜근(懶翁惠勤) 화상 또한 고운암(孤雲菴)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접견하여 도(道)의 요지를 질의하였는데, 나옹은 뒤에 금란가사(金襴袈裟)ㆍ상아불(象牙拂)ㆍ산형장(山形杖)을 선사에게 주어 신표로 삼았다.
조선 태조가 칙명으로 세운 이 「비명」의 기록에서 나옹이 오대산의 고운암에 주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 공민왕이 환암혼수에게 양주 회암사에 주석할 것을 청하였는데, 환암은
그것을 거절하고 오대산 신성암에들어가 머물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오대산 고운암에 머물고 있던 나옹혜근에게
법을 전해 받았다는 것이다. 이 「비명」에 의하면, 환암혼수
역시 나옹의 문도가 되며,7 그 전법처는 오대산이 되는 것이다.
나옹의 행보는 오대산 불교에 일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목은 이색(1328~1396)이 지은 「오대상원사승당기」와 「휴 상인에게 준 글(贈休上人序)」은 그러한 변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석씨 영로암(英露菴)은 나옹(懶翁)의 제자이다. 오대산을 유람하다가
상원(上院)에 들어와 승당(僧堂)이 터만 있고 집이 없음을 보고 곧 탄식하며 말하기를, “오대산은
천하의 명산이요, 상원은 또한 큰 사찰이다. 승당은 성불(成佛)한 곳이요, 시방의 운수도인(雲水道人 행각승)이 모이는 곳인데 사찰이 없을 수 있는가.” 하고, 이에 사방으로 쫓아다니며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인연을
맺기를 청하니, 최판서(崔判書) 백청(伯淸)의 부인인 안산군부인(安山郡夫人) 김(金)씨가 듣고 기뻐하여 최판서와 더불어 모의하고 돈을 내어 희사하였는데, 부인이
스스로 희사한 바가 컸다 한다.
병진년(1376) 가을에 시작하여 정사년(1377) 겨울에 공역을 마쳤다. 그 겨울에 승려 33명을 맞이하여 십년좌선(十年坐禪)을 시작하였는데 5년째인신유는 곧 그 대반(大半)이다. 성대하게 법회를 열고, 그 정성을 다하도록 하니, 그해
11월 24일에 해가 이미 넘어갔는데 승당이 까닭없이 저절로 밝은지라, 여러 사람들이 그 까닭을 괴이하게 여겨 그 스스로 밝게 된 바를탐구하니, 성승(聖}僧 승단 중앙봉 안에 앉힌 좌상[坐像]) 앞으로부터 촛불이 나와있어 여러 사람들이 드디어 크게 놀랐던 것이다. 이제
그 불꽃을 산중의 여러 암자에서 지금까지 서로 이어 나왔는데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는 김씨의 지성의
소치라 한다.
김씨가 그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는 더욱 느끼고, 더욱 믿고, 더욱 그 교를 높여, 노비와 토지를 바치어 상주(常住)할 자본으로 삼았다. 뒷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기문을 나 색(穡)에게 구하였다. 색도 또한 놀라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었던가, 내 전에 듣지 못한 바이다. 대저 등(燈)과 초[燭]는 심지가 있고,기름과 밀[蠟]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불이 있은 연후에 광명이 나오게 마련이다.” 하였다. 이제 불을 붙이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진 것은 부처님의
신령함이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부처님께서 비록 신령하다 하더라도 또 아무런 연유도 없이 그 신령함을
나타냈으니 김씨의 이름이 전함은 지당한 일이다. 승당의 기문은 짓지 않을 수 없도다.
<『목은문고』6, 『동문선』75, 「오대 상원사 승당기(五臺上院寺僧堂記)」>
이 「오대상원사승당기」는 이일스님의 중창에도 불구하고 오대산의 당우들이 여전히 쇠락한 상태이거나 소실된 상태였음을
알게 해준다.
터만 남은 상원사 승당을 재건하는 이가 바로 나옹 혜근의 제자인 영로암이다. 영로암이
상원사에 들렀다가 승당을 재건하고 승려 33명을맞아들여서 십년좌선(十年坐禪)을 하였는데 크게 상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내 나이 열예닐곱 살 때쯤에 유자(儒者)들과 어울려 연구(聯句)를 짓고 술을마시면서
노닐곤 하였다. 그런데 지금 천태 판사(天台判事)로 있는 나잔자(懶殘子)가 우리들을
좋아한 나머지 모두 초청하여 함께 시를 지으면서 읊조리다가 날이 부족하면 다시 밤까지 계속 이어 갔으며, 술이
얼큰해지면 고담준론에다 장난기 어린 우스갯소리를 허물없이 늘어놓기도 하였다. 그때 오선생(吳先生)이란 분이 가끔씩 찾아와서 모임에 참여하곤 하였는데, 모습이 청수(淸秀)한 데다 말솜씨도
능란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휴 상인(休上人)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다. 오선생이 상인에게 명하여 나잔자를 모시고 공부하도록 하자, 상인이
『논어(論語)』와 『맹자(孟子)』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나서는 그 곁을 떠나서 삼각산(三角山)으로 들어갔다. 이듬해인 갑신년(1344,
충혜왕5) 정월에 나잔자가 또 우리들 몇 사람을 데리고 삼각산으로 놀러 갔는데, 그때 휴 상인이 우리를 위해서 동도주(東道主 손님 접대하는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하였다.
상인은 나보다 몇 살 더 많았으나 나하고 무척 사이가 좋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서로 만나는 일이 드물었을 뿐더러, 아예 얼굴조차 보지 못한 지가 또 오래되었다. 그리고 당시에 함께 노닐었던 정랑(正郞) 홍의원(洪義元)과 상사(上舍) 오동(吳仝)과 내시(內侍) 김정신(金鼎臣) 같은 이들은 이미 모두 고인(故人)이 되었고, 지금의 광양군(光陽君) 이공(李公)과 나만 외로이 조정에 몸담고 있을 뿐, 중랑(中郞) 김군필(金君弼)과 정랑(正郞) 한득광(韓得光)은 모두 시골에 내려가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인이 이런 때에 나의 문을 두드릴 줄이야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리고
나잔자가 또 시자(侍者) 편에 나에게 급히 서한을 보내 상인에
대한 일을 매우 자세하게 말해 주었는데, 이는 내가 옛날의 일을 잊어버리지나 않았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이에 내가 그 글을 보고 그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 옛날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였다.
상인은 사중은(四重恩)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는 면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니고 있었다. 또 그의 말을 들어 보건대, 부처님의 형상이나 부처님의 언어 모두가
불도(佛道)에들어가는 데 특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자인 도우(道于)와 달원(達元)으로 하여금 지묵(紙墨)의 시주를 받아서, 주해(註解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