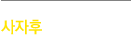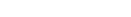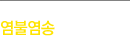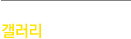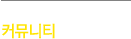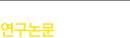[월정사 역사와문화] - 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2-05 14:10 조회4,799회 댓글0건본문
Ⅲ. 조선시대; 질곡을 넘어 역사와 신앙을 품었던 불교성지
2. 조선전기의 오대산 불교(2)-세조와 상원사의 중창
세조는 억불숭유의 기운이
강성하던 조선전기에 가장 열렬하게 불교를 신봉하고 후원했던 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조의 불교부흥
기조는 오대산 불교 특히 상원사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시기에 오대산에서는
상원사가 중창되었는데, 세조가 존경하였
던 신미와 그의 두 제자
학열과 학조의 삼화상에 의한 것이다. 신미(1405?~1480?)는
기화(1376~1433)의 법형이었던 진산의 문도였다고 추정된다. 신미의
제자가 학미(學眉 혹은 覺眉)였고, 학열의 도제(徒弟)가 지생(智生)이었는데, 학미와 지생은
모두 기화(己和)의 문도이다. 또한 기화의
문도인 홍준(弘濬 혹은 洪俊)이 기화의 『금강경』에 『오가해(五家解)』를 추가했는데, 기화의
문도인 야부(冶父 혹은 野夫)와 학조(學祖)가 중교(重校)하였다. 즉, 신미는 나옹혜근의 법손인 기화의 제자로서 나옹의 선풍을 계승하였다. 곧
세조 시기의 상원사 중창은 신미와 그의 스승인 기화, 그리고 법통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나옹 혜근의
상원사 및 오대산 불교권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 상원사 중건의 내용이 「오대산상원사중창기」에
전한다. 억불숭유 정책이 본격화되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대산 불교권이 상원사를 중심으로 중창되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좀 길기는 하지만 전문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오대산은 강원의 경계에 있으며 그 산맥의 뿌리가 3백여 리에 걸쳐 뻗어 있다. 그 웅장하고 깊으며 높고 큰 것이 풍악산(楓嶽山, 가을의 금강산)과 더불어 우열을 견줄 만하다. 산허리를 베고 누운 고을은 주와 군현이 무려 10여 군데가 된다. 산에는 다섯 봉우리가 있는데,높고 낮음이 고르고 대등하며, 대소(大小)가 서로 가지런하다. 바라다보면 부용(芙蓉)이 물 밖에 나온 것 같고, 대각(臺閣)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 옛날부터 ‘오대(五臺)’라 불렀다. 중대(中臺)의 남쪽에 절이 있는데 상원(上院)이라 한다. 거듭 화재를
만났으나 그때마다 일을 주간하는 사람이 다시 짓고는 때로는 폐하고, 때로는 일으켰다. 그러나 그 규모가 협소하고 비색하여 승려가 즐겨 거처할 곳 이 못 되었다.
천순(天順)이 연호를 세운 지 8년(1464) 4월, 우리 세조 혜장대왕(惠莊大王)이 병이 들어 고생한지 열흘이 넘었다. 대왕대비 전하가 우려하고 두려워하여
내관을 보내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 대선사 학열 등에게
묻기를,“중외(中外)의 사사(寺社)에서 주상의 쾌차를 비는 법을 일으키는 것도 다 좋지만 내가 명산승지에
한 사찰을 창건하여 특별히 기원할 곳을 만들어 국가의 안녕을 기도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곳에 나아갈 것입니다. 경
등은 사방을 유력하였으니 반드시 그곳을 알 것입니다. 숨김없이 알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신미 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대산은 우리나라의 명산입니다. 그리고 중대의 상원사는 지덕이
더욱 기이하니 승도가 결제(結制)면 반드시 경침(警枕)의 변이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음식 만드는 사람이 실화(失火)하였는데, 화주(化主)가 힘이 부족하여 서둘러 힘썼으나 겨우 사람만이 비바람을 가릴 정도입니다. 만약
그 옛터에 다시 건축하여, 그 규모와 법제(法制)를 넓게 하면 한 산의 명찰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기축(祈祝)하고 특별히 향과 예물을 내려 불사를 일으킨다면 이 절보다 편리한 곳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 전하가 승려의 말이 진실로 마땅하다고 여겨 전지(傳旨)하여 곧바로 세조에게 아뢰고 승려 학열에게 명하여 절을 짓는 임무를 맡기고 경상감사(慶尙藍司)에게 영을 내려 쌀 5백 석을 배에 실어 강릉부(江陵府)에 운반하고, 제용감(濟用監)에서 비단과 베 1천필을
내어 처음 절을 짓는 경비로 쓰도록 하였다. 얼마 후에 세조의 질병이 점차 평소의 좋은 때처럼 좋아졌다. 대왕대비 전하가 놀랐다가 또 기뻐하며, 그 산의 영험함이 부처의
교화를 입었음에 안심하여, 말 한마디에 마음을 가라앉혔다.
세조가 친히 공덕소(功德疏)를 지어 종친과 재추에게 널리 보이니,
성지(盛旨)를 공경히 받들어 가진 것을 내놓았고 인수왕대비(仁粹王大妃) 전하가 양전(兩願)의 뜻을 높이 계승하여 조(租) 5백 석(石)을 더 시주하여 모자란 것에 보태게 하였다. 이에 학열 공(公)은 기뻐하여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밤에 생각하며, 몸소 독려하여 힘쓰니, 을유년(1465)
3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병술년(1466)에 끝마침을 고하였다.
<「오대산상원사중창기(五臺山上院寺重創記)」 중에서>
이 부분은 오대산과 상원사의
지리적 입지를 설명하고, 상원사를 중창하게 된 연유와 경과를 설명한 부분이다. 상원사 중창의 연유는 상원사 자체의 화재와 입지규모로 인한 문제 그리고 세조의 병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조가 병이 났을 때, 대왕대비가 신미와 학열
두 스님에게 대책을 물으면서 “중외(中外)의 사사(寺社)에서 주상의 쾌를 비는 법을 일으키는 것도 다 좋지만 내가 명산승지에
한 사찰을 창건하여 특별히 기원할 곳을 만들어 국가의 안녕을 기도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곳에 나아갈 것”이라면서
명산승지의 사찰을 천거하도록 한 것이 시초가 된다.
앞선 고려 시대가 불교국가의
시대였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원당, 원찰을 조성하는 풍습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도 그 유풍은 잔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곧 왕이 병이
들어 고생하자 앞선 시대의유풍에 따라 원당을 조성하여 왕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려는 대왕대비의 의지가 상원사 중창불사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왕대비의 의지에 부응하여
신미와 학열 등의 스님이 오대산 상원사를 그 입지로 천거하였는데, 다만 상원사는 자주 화재가 일어나서
중창을 거듭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입지 규모가 작아서 승려들이 머물며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대왕대비는 신미 등의 입지 천거를 받아들여 상원사 중건의 비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하였는데, 그 얼마 후에 세조의 병이 쾌차하게 되었다. 이에 세조가 직접 「공덕소(功德疏)」를 짓고 다시 중창비용을 더하여 제공하였으며, 중창불사는 1465년3월에 시작하여 1466년에
끝마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창불사의 인연에 관한
기록은 세조의 치병문제, 왕과 국가의 안녕을 빌 수 있는 원당 혹은 원찰의 필요하다는 당시 왕실의 인식, 그리고 그러한 불사의 과정에 나옹으로부터 기화를 거쳐 신미와 학열로 이어지는 나옹과 기화의 문도들에 의한 노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불전의 동서에 모두 상실(上室)을 두었는데, 공은 별도의
거처를 정교하게 만들고, 상실의 양 벽을 헐어 장지(障子)로 대신하였다. 만약 큰
법회를 열고 정진하게 되면, 그 양쪽의 장지를 들어 올려 불전과 상실이 확 트여 하나가 되었다. 남쪽 회랑 사이에 누각 5칸을 세워 종(鍾)과 경(磬) 등의 도구를 두게 하고 이어 그 아래에 문을 두어 출입하게 하였다. 동상실(東上室)의 동쪽에 나한전(羅漢殿)을 세우고, 서상실(西上室)의 서쪽에 청련당(靑運堂)을 세우며, 청련당의 서쪽에
또 재실(齋室), 주방, 승당, 선당, 창고, 목욕실을
두었다. 마땅히 얻어야 할 것에 없는 것이 없었는데, 기둥을
세어보니 총 56개였다. 헛간 곁에는 돌을 뚫어 물통을 만들고, 나무를 도려내어 통(筒)을 만들어 냉천(冷泉)이 빠르게 흐르도록 하여 사용함에 고갈됨이 없었다. 일용 집기들을 모두 넉넉히 갖추었다.
강릉에는 예로부터 봉전(葑田) 수백 결이 있었는데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는 절에 소속시켜달라고
청하였다. 그것을 수전(水田)으로 만들어, 수백 석(石)을 파종하고, 결실 맺은 것을 해마다 수확하여 절의 유지비로 썼다. 인수왕대비 전하가 절에 탱화를 조성하고자 또 조(租) 150석을 헌납하고, 선고비(先考妣)를 위하여 매일 저녁 시식(施食)하도록 조 60석 을 주었다. 세조가 절의 불사가 끝났다는 소리를 듣고, 또 쌀 5백 석과 포 1천 필을 하사하여 의발(衣鉢\), 좌구(坐具), 탕약(湯藥) 등 사사(四事)를 두루 갖추게 하고,시를
잘하는 승려 52명을 모아 크게 낙성회를 베풀었다.
<「오대산상원사중창기(五臺山上院寺重創記)」> 에서
「중창기」의 이어지는 부분인데, 불전의
동서에 상실을 설치하였는데, 큰 법회를 개최할 때는 동서의 상실과 불전을 통하게 하여 행사를 치르는데
무리가 없게 하였으며, 이 외에도 동상실의 동쪽에 세운 나한전(羅漢殿)과 서상실(西上室)의 서쪽에 세운 청련당(靑運\堂) 및 그 청련당의 서쪽에 다시 재실(齋室)과 주방, 승당, 선당, 창고, 목욕실
등이 설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세운 기둥이 모두 56개라는
설명에서 불사의 규모가 장대했음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전각의 규모는 세조 시기에 이루어진
상원사 중창이 대단히 큰 사업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당연히 이 같은 장대한 규모는 그 중창 못지않게
중창된 전각들과 거기에 주석하는 스님들을 위한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어지는 인용문에서는 강릉의
봉전(葑田) 수백 결을 받아 수전(水田)으로 만들고, 그 생산물을
새롭게 중창된 상원사의 유지비용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 다음에 이어지는 「중창기」
인용문에도 보이는 것처럼, 세조가 순행한 후에는 내수사의 노비를 하사하는 것은 물론, 전지에 부과되는 세금과 소금가마에 부과되는 세금은 물론 요역까지 전부 면제하여 상원사의 유지에 모자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창뿐만 아니라
그 후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조정과 왕실 차원에서의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조의 정치적 입장이 상원사 중창에 투영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내용의 일단을 이어지는「중창기」 말미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에 세조가 강원도를 순행할 때, 산
아래 성오(省烏) 지역에서 머물렀다. 대왕대비
전하와 왕세자와 호종하는 문무 신료들을 거느리고 상원사에 행차하였다. 이날 낙성 개당식(開堂式)에 가는데, 산수는 수려하고 골짜기는 청유(淸幽)하며, 전각과 요사는 화려하고, 승도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법기(法器)들이 다 같이 소리 내고 범패를 함께 불렀다.
세조가 몸소 불전에 이르러 세 번 향을 사르고, 예배를 올렸다. 시종하는 군료(群僚)들이 또한 막배(膜拜,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절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어 공을 불러 한참 동안 있었는데, 공은
산중의 고적(故蹟)을 거론하고, 또 본사(本寺)의 흥폐와 시말 그리고 다시 불조(佛祖)가 동서에 몰래 전한 심법의 요결(要訣)을 전하였다. 말의 기세가
신속하고 예리하였으며, 이치는 깊고 오묘하였다. 말이 모두
임금의 뜻에 맞으니, 세조가 크게 기뻐하여 내탕금과 베, 비단을
하사하였다. 법회가 끝나자 어가(御駕)는 머무르는 곳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학열 등이 승도와 대중을 이끌고 행궁(行宮)에 가서 은혜에 감사드렸다.
성화(成化) 6년(1470) 경인년, 지금의 우리 주상전하가 상원사를 세조대왕의 원찰로 삼았다.
또 전날에 임금이 거동하여 머무르던 곳이므로, 특별히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를 하사하고 잡요(雜徭) 및 절에 속한 전지(田地)에 부과하는 세금 외에 염분(鹽盆)에 부과하는 세금을 왕패(王牌)를 내려 모두 영원토록 면제하였다. 이후 8년에 공이 절의 불사가 이미 완결되었음을 알리고,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려는 뜻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니, 임금이 청을 허락 하였다. 공은 납의를 입고, 훌쩍 남쪽으로 갔다.
떠나기 전에 기록을 남겨 영구히 전하기를 청하니, 이에 신이 명을 받아 그 일을 기록한다. 신이 듣건대 인성(仁聖)의 군주는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데 있어 몸소 인의(仁義)의 덕을 행하여 크게 변화하는 근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청정의
도를 숭상하여 필요없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 혜장대왕은 몸소 큰
난리를 평정하고, 능히 국가를 편안하게 하였고, 몸을 단속하여
덕을 수련하여, 선을 위함에 힘을 쏟고, 기강을 세워 만세에
교훈을 드리워 대화(大化)의 근본이 이미 세워졌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기구를 넓혔으니, 드디어 동방에 다시없는 태평을 이루었도다.
한편 생각하면 석씨(釋民)는 역외(城外)의 대성(大聖)이니 그 도는 자비청정을 귀하게 여기고, 이익과 은택을 미루어 주고 또한 나라와 가정을 복되게 하였고, 임금과
어버이가 장수를 누리게 하였다. 성학(聖學)은 만물을 드러내 보이고, 삼장구부(三藏九部, 경전의 총칭)의 문장과 일심(一心) 만법(萬法)의 으뜸으로 미묘함을 연구하지 앓은 것이 없으니 마음으로 그 뜻을 헤아려야
한다.
오대산이 비록 멀고, 상원사가
비록 벽지이지만 도를 구하는 무리가 결집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개조를 해야 하는데, 특히 그 비용을 하사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공사가 끝났을 때 에는 내탕금을 내려 주어 낙성의 법회를 베풀고, 범채(梵采)를 널리 선양하였다. 두루
법계의 함령들에게 미쳐 함께 끝없는 이로움과 즐거움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 이에 임금께서 친히 거둥하여
이 산골짜기에 오셨으니, 바람과 구름이 색을 바꾸고, 초목이
살아 빛을 발하도다. 천지가 있은 이후로 이 산이 있어 왔으니, 이미
지나간 천백(千百) 년이나 앞으로 마주할 천백 년 동안에 이처럼 훌륭한 일이 다시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멀고 후미진 땅에 산마루와 물가에 사는 백성들이 임금의
수레 소리를 듣고 휘황한 깃발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두 임금의 은혜를
입었으니, 미담(美談)이 되어 억만 년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것은 의당 훌륭한 유학자와 큰 문장가를 청하여 아송(雅頌)을 짓게 하고, 암석에 새겨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하지, 우매한 신은 진실로 그 훌륭함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성지(聖}旨)를 받들었으니 감히 글이 졸렬하다고 사양할 수 없었다.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영산부원군(永山府院君) 신 김수온 머리를 땅에 엎드려 절하며,
명을 받들어 삼가 찬한다.
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