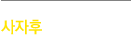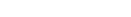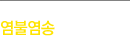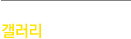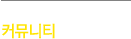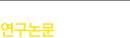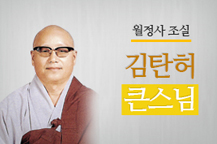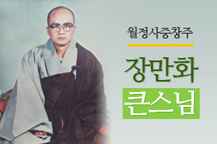<정감록>의 슬픈운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8-27 12:03 조회4,929회 댓글0건본문
※ <정감록>의 슬픈운명
ㆍ‘정감록’의 슬픈 운명
… 민중을 혁명의 힘으로 묶어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민중의 바람이 깃든 예언서를 보자.
사실 18세기 최고의 금서라면
<정감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정감록>에는 많은 예언이 담겨 있지만
크게 보면 이씨 조선이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렴된다.
예언서는 고려 말에 부흥했다가
조선 초기에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유행했던 한 예언의 운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자장군(木子將軍)의 칼과
주초대부(走肖大夫)의 붓과
배의군자(非衣君子)의 슬기로써
삼한(三韓)을 바로잡는다.”
여기에서 목자장군은 이성계를,
주초대부는 조준을, 배의군자는 배극렴을 가리킨다.
이 예언은 고려가 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왕조가 시작된 뒤에는 금지해야 할 예언이 된다.
신하의 역할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사실은 역모의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 된다.
현재의 임금이 역성혁명으로 들어선 왕이라면
능력 있는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태종과 세종 대에도 이런 예언서와 관련된
역모가 있었다. 이후 태종은 예언서의 개인 소장을
금지하고 거두어들인 예언서는 불태우라고 지시했다.
조선 최초의 대규모 분서였다.
1801년 전라감영에 잡혀 들어간 유관검은
“서양 군함의 힘을 빌려 조정에 무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유관검의 이런 자백은
당시 천주교도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유관검은 진산사건 때에도 체포되었다가
배교하고 풀려났던 인물이다.
그러나 신해박해 때 대역 죄인으로 능지처참되었다.
■ ‘현실개혁’의 간절한 바람 담아
그렇게 씨가 말라가는가 하던 예언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다시 등장했다.
그런 흔적은 역모사건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면 광해군 4년에는 최경이
<천서(天書)>와 음양서(陰陽書)를 읽고 역모를 꾸몄다
하고, 동 8년(1616년)에는 최충의가 구월산에서
예언서를 얻어 본 뒤 반역을 도모했다는 식이다.
조선 조정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으로 만들어진
이런 예언서에는 현실개혁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겼다.
고성훈은 <정감록>에 담긴 바람을 분석한 적이 있다.
①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바람,
②가혹한 현실의 모순에 맞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바람,
③역성혁명에 대한 바람,
④역성혁명을 현실화시켜줄
해도기병설(海島起兵說)에 대한 바람이 그 내용이다.
실제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매우 혁명적이다.
“아전이 태수를 죽이고”
“대대로 국록을 먹는 신하는 죽음이 있을 뿐”이며
“삼강오륜은 영원히 없어질 것이고
피난지에서 부자는 죽지만 가난한 사람은 살 것”
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감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영조 15년(1739년)이다.
서북지방에 널리 퍼져 있으니
그 책을 금지하고 불살라야 하며,
그 뿌리를 캐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영조는 성군처럼 대답한다.
“그런다면 진시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유학을 통해 바른 기운을 기르면 저절로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을 쓴 모습일 뿐이다.
<비변사등록>을 보면 두 달쯤 전에
수사가 비밀리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중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정감록>은
많이도 필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서는
민중을 규합해서 혁명의 힘으로 묶어내지 못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성공한 혁명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대혁명의 지적인 기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금지된 베스트셀러들이 있다.
라틴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쓰여진 책들이다.
당시 민중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혁명적인 인쇄물이
엄청나게 뿌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조선에는
아직 대중 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글로 쓰여진 책이 많지 않았다.
지난 회에 언급했지만 아마도 민중이 열광했을
박지원의 작품들 역시 한문으로 쓰여졌다.
혁명의 염원을 담은 <정감록> 역시 한문이 아닌가.
이런 이상한 전통(?)은 훗날 동학의 경전까지 이어진다.
<동경대전> 역시 한문으로 쓰여졌다.
■ 한글로 쓰여진 천주교 서적 급속히 파급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천주교가 민중들 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책이 아니었나 싶다.
동양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한글로 쓰여진 책이 드물었던 시절에 천주교는 달랐다.
1801년 한문본 천주교 서적은
대략 120여 종이었는데
이 가운데 86종 111책이 한글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었다.
한글본이 이처럼 많이, 빠르게 마련된 이유는
신도들 가운데 여자들이나 중인 이하의
하층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최초의 외국인 신부인 주문모가 조선에 온 것은
1794년 12월이었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죽었다.
그가 활동했던 6년여 동안 조선의 천주교도는
두 배 반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주문모는 끊임없이 쫓기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아직 조선의 민중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능력도 충분치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
그것은 <정감록>의 영향일지 모른다.
성공한 혁명의 경험이 없었던 당대 민중들은
바다를 건너온 구세주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실제로 주문모를 <정감록>에서 말하는
구세주라고 여겼던 흔적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던 천주교도들이
서양의 무력에 기대어 세상을 변혁시키고 싶었던
바람을 적은 글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문모는 순순히 자수했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말했다. 그리고 1801년 그 끔찍한 신유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