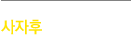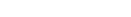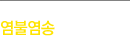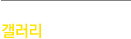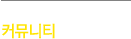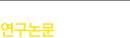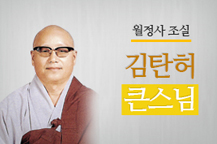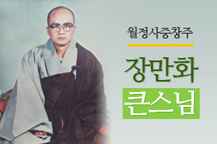통도유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7-25 13:08 조회5,106회 댓글0건본문
(통도사에 얽힌 신화와 전설)
통도사(通度寺)는
한국 불교의 종가(宗家)에 비유될 수 있다.
통도사에는 금강계단(金剛戒檀)이 있고,
신라 7세기 중반 무렵부터 스님이 되려고 하면
이 금강계단에서 계율을 받는 의식을 치러야만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강계단을 통해야만 스님이 될 수 있었다.
계율을 지켜야만 고요한 상태에 들어갈수 있고,
고요해야만 지혜가 생긴다.
수행자의 첫 단계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율 안 지키면
성스러운 세계에 들어갈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불교이다.
신라의 자장율사(慈裝律師)때부터 이어져 온
계율의식이 보존된곳이 통도사이고
통도사의 핵심은 금강계단이다.
금강계단은 한국불교의 성지이다.
성지(聖地)는 종교적 영험을 간직한곳이다.
영험은 어떤 장소에서 오는 것일까?
자장율사는 왜 여기에다가 금강계단을 설치했을까?
전설에 의하면 이 금강계단 자리는 원래 늪지대였다고 한다.
늪지대를 흙으로 매립해서 금강계단을 만든 것이다.
한국 불교사찰의 창건설화를 보면 늪지대를 메꿔
그 위에다가 절을 지은 경우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익산의 미륵사지도 원래 물이 고여 있던 늪지대였고
김제의 금산사터도 늪지대였다.
장흥의 보림사, 치악산의 구룡사도 그렇다.
늪지대를 메꿔 거기다가 절을 지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도사인 것이다.
왜 물이 고여 있는 다리에다
성스러운 절(금강계단)을 지었을까?
우리가 보통 집터를 잡을때는
지하로 흐르는 수맥(水脈) 자리는 피하고 본다.
물이 흐르는 곳은 금기에 석한다.
수맥이 흐르는 집터를 잡고 살면 우선 건강이 나빠진다.
물이 흘러가면서 파생시키는
그 어떤 에너지 파장이 인체의 고유한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이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왜? 고대 불교 창건 설화에 보면
이런 늪지대에는 용(龍)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설명된다.
고승과 용은 이 터를 두고 서로 대결한다.
자장율사도 도력을써서
구룡신지(九龍神池)에 살고 있던 여덟 마리의 용들을 쫓아내고 절을 짓는다.
그 용들 가운데 마지막 한 마리는 남아서
자장율사에게 항복하고 절을 지키는 신장으로 남는다는
설화이다.
통도사 대웅전 앞에도 둥그런 모습의 작은 연못이 있고
영산전(靈山殿) 앞에도 작은 연못이 있다.
마지막 남은 용 한 마리가 살수 있도록
배려한 장치이기도 하다.
대웅전 앞의 구룡지(九龍池)가
용이 들어가는 입구라고 한다면
약간 떨어진 거리의 영산전 앞의 구룡지는
용이 빠져 나오는 출구에 해당한다.
구룡지가 한 개가 아닌 두 개,짝으로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용은 지상에 없는 동물이다.
열두띠 가운데 지상에 없는 상상의 동물이 바로 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신화와 불교 사찰에는
용에 관한 전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일까?
허구의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연못도 두 개나 마련되어 있을 정도이다.
허구라고 한다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양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가?
서양신화에서는 용이 사악한 동물로 묘사된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다.
그래서 서양신화에서는 용을 때려 잡는 인물이 영웅이 된다.
서구의 용은 날개가 달린 용들이 많다.
이 날개 달린 거대한 괴물이
하늘을 날라 자니면서 인간을 잡아 채거나,
가축을 물어가고 인간에게 피해를 끼친다.
용은 사악한 괴물인 것이다.
서양영화에 묘사되는 용들의 이미지가 대개 그렇다.
그러나 동양에서 용은 사악한 동물이 아니다.
제왕 또는 군왕의 이미지이다.
그 모양도 서양과 다르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모습이 아니다.
대개 물에서 사는 영물로 묘사된다.
동양에서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水神)으로 묘사된다.
바다, 호수, 강물에서 사는 동물이 용이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때에도
용신에게 제사 지내는게 아시아의 고대 제의(祭儀)였다.
가뭄이 들어서 사람이 전부 죽게 생겼을 때
이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빌었던 대상이 용이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아시아는 농경사화였다는 점에서 그 비밀이 있다.
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물이다.
수경농법인 벼농사가 그 대표적이다.
비가오지 않으면 쌀농사는 불가능하다.
쌀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서양은 동양처럼 농경사회가 아니었다.
물론 서양도 곡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목축의 비중이 동양보다 컸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교역도 비중을 차지했다.
농경사회인 아시아에서 쌀은 물에서 생산된 것이고,
이 물을 지배하는 고대의 신은 용이었다.
용신은 밥줄을 쥐고 있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용은 운석 충돌로 인하여
다른 공룡들이 대부분 멸종된 상황에서
물속에 살던 수룡들이 늦게까지 살아 남았고,
이 수룡들이 아마도 고대사회에서
신격으로 숭배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불교가 생기면서 이 용신의 역할이
부처로 전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수가 있다.
우리 고대어에서 용을 ‘미르’ 라고 불렀다.
‘미리내’는 용천(龍川)의 뜻이다.
물을 의미하는 고대어가 ‘미’이다.
‘미역’, ‘미숫가루’, 그리고 일본어의 ‘미즈’가
모두 물과 관련있다.
미르도 마찬가지다.
한자의 미륵(彌勒)도 그렇다.
그 발음이 공교롭게도 ‘미르’와 비슷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미르’가 ‘미륵’으로 대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미륵불교가 들어오면서 용이 살던 늪지대에다가
미륵불을 모시는 법당이 들어선 것이
그러한 추측의 증거로 삼을수 있다.
미르가 미륵이 된 셈이다.
통도사의 구룡신지에 살던 용들을 쫓아내고
자장율사가 절을 지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도사는 지형이 특수하다.
영축산은 해발 1천미터가 넘는 고산이다.
그런데 영축산 아래로는 2-3백 미터의
그리 높지 않은 봉우리와 언덕들이 포진한 형국이다.
이봉우리 중간 중간에서 물이 솟는다.
고지대에서 물이 나오는 지형이 통도사 전체 지형이다.
이 점이 특이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