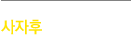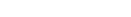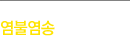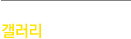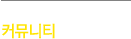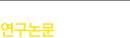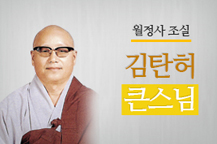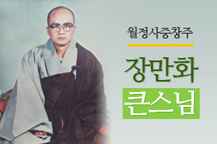각성스님/ 화엄사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행스님 작성일18-04-30 22:13 조회3,125회 댓글0건본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네
각성스님
(부산 화엄사 조실)
탄허 큰스님의 『화엄경』 역경사업은 전 세계 불교계를 돌아봐도 위대한 불사입니다.
『신화엄경 합론』은 본경 『화엄경』 80권과 『통현론』 40권, 청량국사의 『화엄소초』 150권, 『회석』7권, 『현담』 8권, 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 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 그리고 탄허 큰스님의 주석 등 287여 권을 집대성해 놓은 어마어마한 불사입니다.
이런 대불사엔 또 그만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탄허 큰스님은 『신화엄경 합론』의 출판을 앞두고 출판비용이 없어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1967년 3월 경 큰스님은 원고를 탈고하셨지만, 출판 자금이 없어 삼척 영은사에 원고를 놓아두신 채 1년을 깊은 상념과 갈등 속에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 월정사의 형편으로는 출판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지요. 1969년 월정사 대웅보전 준공 불사를 끝낸 후 부산에서 출판의 여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 삼덕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큰스님은 탈고한 원고의 교정과 수정을 매일 새벽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9시간씩 약 8개월 동안 하신 끝에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원고의 분량이 무려 트럭 한 대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큰스님을 포함한 10여 명이 돌아가며 세 번 읽고 검토하여 교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원고를 번역하고 쓰는 원력도 대단했지만 그것을 마지막 자구 하나까지 꼼꼼하게, 정확하게,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수정하고 교정을 본 정성도 큰스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출판비로 어려움을 겪으셨으면서도 일본 불교계에서 『신화엄경 합론』 원고를 6000만 엔에 팔라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출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인에게 원고를 팔지는 않는다!”고 일거에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6억 원이면 강남의 아파트 40채는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야말로 재고(再考)할 틈도 주지 않고 단칼에 잘라버리셨다고 합니다.
『현토역해懸吐譯解 신화엄경 합론新華嚴經合論』. 이 대 역서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한국불교뿐 아니라 세계불교의 역경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큰스님이 삼본사 수련소 시절(1936년~1940년대 초) 스승 한암 대종사로부터 “『화엄경 합론』에 토를 달아서 출판 보급했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들은 지 30년이 훨씬 더 지나 이루신 불사였습니다. 『화엄경』 번역을 시작한 1956년 오대산 수련원 시절부터 따지면 만 20년이 소요되었고, 마지막 논소(論疏)를 합하여 정리하는 데만도 꼬박 9년이 걸린 대작 불사였습니다.
화엄사상의 철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연기(緣起)입니다. 우주의 만물은 모두가 무량무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고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진연기(無盡緣起)지요. 사법계(四法界)·십현연기(十玄緣起)·육상원융(六相圓融)·상입상즉(相入相卽) 등은 이 무진연기를 설명하는 화엄사상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을 우리 불교 역사에서 가장 잘 정리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분으로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효스님하면 화쟁사상이지요. 화쟁사상이 뭐냐? 어느 일종(一宗)·일파(一派)에 구애됨이 없이 “만법(萬法)이 일불승(一佛乘)에 총섭되어야 하는 것은 마치 대해(大海) 중에 일체 중류(衆流)가 들어가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대·소승, 성(性)·상(相)·돈(頓)·점(漸)의 상호 대립적인 교의를 모두 융회하여 일불승(一佛乘)에로 귀결시키려 한 것입니다. 즉 “뭇 경전의 부분적인 면을 통합하여 온갖 물줄기를 한맛의 진리 바다로 돌아가게 하고, 불교의 지극히 공변된 뜻을 열어 모든 사상가들의 서로 다른 쟁론들을 화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효대사의 사상이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당시 영축산에는 수많은 사상체계들이 형이상학적 문제로 서로 대립,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선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실한 실천적 인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설하셨던 것입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화(和)의 원리는 실천원리를 중시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신라통일기에 나타난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부처님 열반 후 대승에 이르기까지의 화의 정신의 시대적 재현 또는 재창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신라에 들어온 불교 이론들이 너무나 다양하여 논쟁이 격심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이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론들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이론적인 상호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이 화쟁의 방법입니다. 화쟁의 근본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일심(一心)에 두었습니다. 화쟁은 언어적으로 표현된 이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원효에 따르면 진리를 전달하고자 언어나 문자를 쓰지만, 언어나 문자는 진리의 전달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즉 언어와 진리가 고정적이고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진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왜곡시키기도 하는 언어의 이중적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 봐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의 이론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 연후 극단을 버리고 긍정과 부정을 자유자재로 하며, 경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화쟁의 방법은 일차적으로 부정을 통하여 집착을 떠나게 됩니다. 부정만으로 집착이 없어진다면 좋은데 도리어 부정 자체에 집착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부정의 부정으로 나아가면서 긍정과 부정의 극단을 떠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긍정과 부정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 가지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두루 널리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견해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사상입니다. 현대의 문명사회는 아주 다양해졌고 다원적이며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명과 과학적 발전들을 획일적 잣대로 재려고 하면 백번 만번 실패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댓글목록